[창] 공화국의 적

-
- 첨부파일 : 20250419004015896.png (221.0K) - 다운로드
-
73회 연결
본문
조효석 영상센터 뉴미디어팀 기자
잘 차려입은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뒤엉켜 난투를 벌인다. 멋들어지게 콧수염을 기른 신사도, 머리칼을 기품 있게 말아올린 숙녀도 너 나 할 것 없다. 포크와 술병을 치켜들고, 혹은 멱살을 움켜잡거나 삿대질하며 서로를 죽일 듯 노려본다. 그들 앞에 차려져 있던 성찬은 바닥에 나뒹군 지 오래고, 위로는 샹들리에가 깨진 채 대롱거린다. 이 모습을 담은 그림 아래에 글귀 하나가 적혀 있다. “그 얘길 해버리고 말았군(Ils en ont parle).” 19세기 말 프랑스 신문 ‘르피가로’에 실린 만평의 일부다.
당시 프랑스 사회를 두 쪽으로 가른 건 젊은 장교 알프레드 드레퓌스의 간첩 사건이었다. 익히 알려졌듯 군부가 유대인 드레퓌스에게 누명을 씌운 사건이다. 드레퓌스의 억울함을 밝히려 한 양심적인 장교도 있었지만 군 수뇌부는 그마저 감옥에 보냈다. 대문호 에밀 졸라는 명문 ‘나는 고발한다’를 발표해 사건의 부당함을 폭로했으나 명예훼손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망명을 떠나야 했다. 그렇잖아도 취약한 공화국의 권위와 기반을 흔들어놨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진실 공방 이상이었다.
졸라는 ‘진실이 행진하고 있으며, 무엇도 그걸 멈출 수 없다’고 적었다. 그의 글대로 10여년 뒤 프랑스 법원은 재심에서 드레퓌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문제는 끝이 아니었다. 이미 무리하게 사건을 은폐하려다 내각이 2년 새 두 차례 무너졌고, 판결을 계기로 군부 옹호 여론과 반유대주의가 터져 나왔다. 유대계 지식인층의 선동으로 억지 무죄 판결이 나왔다는 음모론이 수십 년 이어졌다. 당대의 일상에서 드레퓌스라는 단어는 만평이 풍자했듯 금기어나 마찬가지였다.
한국 사회를 보며 당시 프랑스 사회를 떠올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전말부터가 드레퓌스 사건을 연상시키는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은 정권을 흔든 기폭제 중 하나였다. 여기에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든 일련의 의혹들, 또 계엄과 대통령 파면까지 거치며 우리 사회는 상대 진영을 향한 저주와 분노가 일상이 됐다. 가족이나 친구, 연인 사이에도 관련 주제를 꺼냈다가 원수처럼 싸웠다는 얘기가 흔하다. 전에도 진영이나 지향에 따라 갈등은 있었지만 적어도 민주화 이후 이 정도인 시절이 있었나 싶다.
사실 드레퓌스를 둘러싼 프랑스 사회 갈등의 본질은 진실 그 자체에 있지 않았다. 국가의 명예와 체제를 향한 충성심을 내세운 민족주의자들은 군이 조작한 증거를 신봉했다. 위선적인 지식인층을 향한 대중의 반발과 유럽에 횡행한 반유대주의 역시 한데 뭉쳤다. 이들에게 중요한 건 진실 자체보다 진영의 승리와 체제의 권위, 존속이었다. 이걸 인정하면 싸움에서 진다는 위기감과 우리 편을 버리면 같이 무너진다는 공포, 즉 감정이 갈등의 진짜 연료였다.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은 한층 복잡하지만 공통점을 찾을 수는 있다. 상대에게 지면 끝장이라는 공포가 갈등의 진짜 이유라는 점이다. 진실에 어긋난 궤변과 억지가 법정에서조차 계속되고, 사상 유례없는 위헌적 조치와 법적 꼼수가 진영을 막론하고 반복되는 모습은 공포라는 감정을 들지 않고선 해설이 불가능하다. 지면 세상이 끝나는 싸움에 절차와 법치로 작동하는 공화국의 원칙이 발 디딜 자리가, 진실이 설 자리 따위가 있을 리 없다.
공화국이라는 체제란 진실을 드러내는 것으로 무너지긴커녕 강해진다. 드레퓌스 사건이 프랑스 사회에 던진 교훈도 같았다. 지지하는 진영이 다르고 신뢰하는 인물이 다를지라도 우리에게는 공화국의 원칙을 지켜나갈 시민으로서의 의무가 있다. 이를 부정하는 자야말로 우리가 손잡고 맞서야 할 체제의 진짜 적이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이 의미하는 것도 다르지 않다. 자기 확신과 오기로 절차와 법치를 무너뜨리고 초법적 폭력을 휘두른 자는 체제와 양립할 수 없다.
공포가 진실과 원칙을 짓누를 때 체제는 스스로 무너진다. 다가올 선거에서 누가 권력을 잡느냐보다 중요한 건 우리 사회가 이를 얼마나 잘 기억하느냐다. 비단 대통령의 폭주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근래 진영 또는 정파 간 갈등과 정치적 유불리로 진실과 원칙이 무시당하는 일을 수없이 목도했다. 채 상병 사건뿐 아니라 그렇게 드러나지 못한 모든 진실을 찾아내고, 또 무너져 내린 모든 원칙을 착실하게 회복해야 한다. 그제서야 우리는 비로소 공화국을 온전히 지켜냈다고 말할 수 있다.
조효석 영상센터 뉴미디어팀 기자 [email protected]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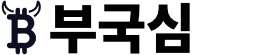

댓글목록0